<11> 뒷산에 사는 새
산에 가서 등산만 하고 오는 건 싫다고 하는 남자의 등산 중 딴짓
뒷산에서 새를 관찰하다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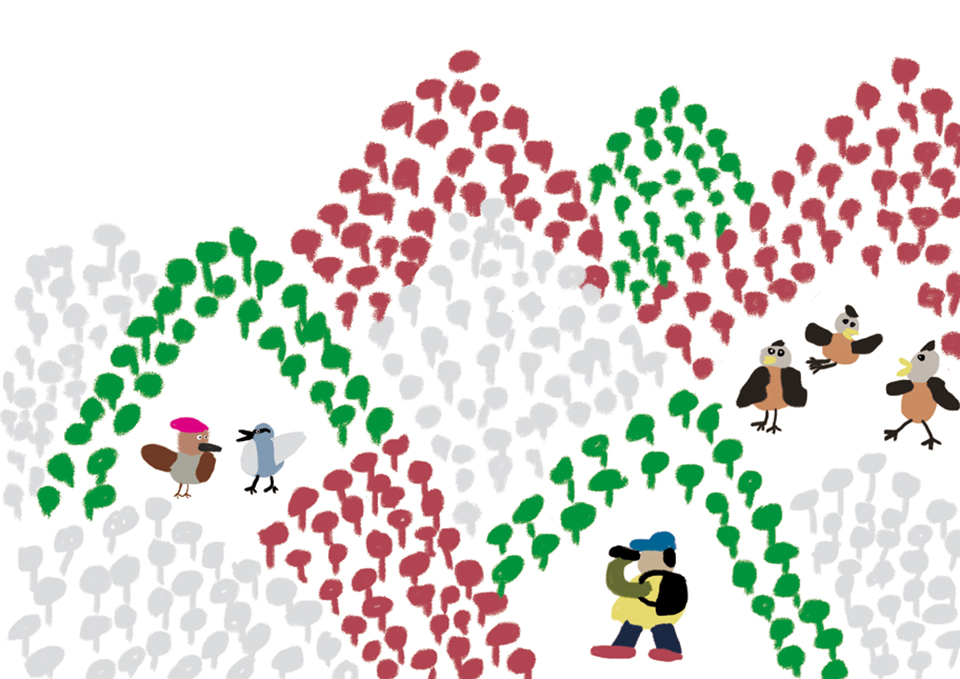
요즘 아침 우리 집 주변은 꽤 시끄럽다. 새들이 모여서 떠들기 때문이다. 수십 마리가 모여 페스티벌을 진행하는데, 그 소리가 우리 집 10층의 작은방 창을 뚫을 정도다. 얘네들 때문에 쉬는 날 늦잠을 못 잔다. “야! 그만 떠들어라, 잠 좀 자자”라고 소리칠 수도 없고, 1층까지 내려가 새들을 쫓아내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그랬다간 잠이 완전히 달아날 것 같아 그냥 참아왔다. 저 많은 새들이 추운 겨울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던 걸까?
어느 주말 늦은 아침, 쓰레기를 버리려고 1층에 내려갔다가 드디어 놈들과 만났다. 그런데 나는 차마 그 새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. 왜냐하면 녀석들은 너무 작았고, 요 작은 녀석들이 어디에서 페스티벌을 열었나 기웃대다가 그만 그들의 “짹, 짹” 소리에 홀려버렸다. 그 소리가 너무 좋았다. 마침 주변에 햇살이 쫘악 비쳤는데, 여기에 새들의 지저귐이 더해지니 그 자리에서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들이켠 것 같은 상쾌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.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쓰레기장 옆이었는데도 말이다.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녀석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 것인지 상상했다.
“야! 이 나뭇가지는 우리 집이야. 근처에 얼씬도 하지마!”
“여기가 무슨 너네 집이니 우리가 예전부터 맡아놨어.”
뭐,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나에겐 아름답게 들릴 뿐이었다. ‘산에 가면 새들이 더 많겠다!’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뒷산으로 도망(?)쳤다.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.
“나가서 새들이랑 살아!”

큰오색딱따구리
산에 들고 보니 새 찾는 게 어려웠다.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쉬고 있는 건지, 아니면 먹을 걸 찾으러 죄다 마을로 내려간 건지 도통 눈에 띄지 않았다. 30분쯤 고개를 들어 두리번대다가 인적 드문 산길로 방향을 틀었다. 그러자 얼마 안 가 새가 나타났다. “아, 새다!” 새는 부리를 나무에 부비거나 사정없이 쪼고 있었다. 딱따구리였다. 저렇게 나무를 쪼아 대면 머리가 상당히 어지럽겠는걸, 부리는 괜찮나? 도중에 눈알이 튀어나오는 게 아닐까? 딱따구리가 쪼아대고 있는 나무 밑에 서서 오랫동안 관찰했다. 물론 스케치를 하면서. 나중에 찾아보니 내가 본 딱따구리는 ‘큰오색딱따구리’였는데, 녀석이 나무를 쪼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. 먼저 나무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혀를 집어넣은 다음 곤충의 유충을 잡아먹는다. 아니면 더 큰 구멍을 뚫어 둥지를 만든다. 곧 알을 낳을 모양인지 녀석은 목에 강력한 스프링모터가 달린 것처럼 “따다다닥” 나무를 쪼았다. 저렇게 해도 머리가 괜찮다고 한다. 보통 큰오색딱따구리는 1초에 18~22번 부리로 나무를 두드린다고 한다. 부리에 탄성이 있고, 머리뼈가 스펀지 구조로 되어 있으며, 또 머리뼈와 뇌 사이에 액체층이 있어서 진동을 차단한다고 한다. 나무를 쪼는 대신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애벌레를 잡으면 더 쉽지 않을까? 뭘 저렇게까지 힘들게 살까 싶었다.

바위종다리
또 다른 새를 찾아보기로 했다. 숲을 헤치고 올라 커다란 바위 아래 다다랐다. 여기서 밤톨만 한 녀석들이 바위 위에서 재잘대고 있었다. 참새인가보다 했는데, 자세히 보니 모양이 살짝 달랐다. 스마트폰을 꺼내 얼른 사진을 찍고 대충 그림을 그렸다. 알고 보니 이 새는 바위종다리라는 참새의 사촌격인 녀석들이다. 얘네들은 참새와 달리 왜 산에서 살까? 게다가 왜 위험한 바위에 저렇게 모여 있을까? 굉장히 궁금했는데,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가 없어 포기했다. 그런데 어느 날 집 근처에서 바위종다리를 봤다. 바위종다리와 참새는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의 차이와 비슷한 걸까? 어쨌든 바위종다리들은 사람이 무섭지 않은 모양이었다. 내가 서있는 코앞까지 다가와 ‘이 사람은 왜 나를 보고도 먹이를 내놓지 않을까?’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았다.

직박구리
멋진 머리 모양을 가진 새도 봤다. 옛날에 유행했던 ‘울프컷’을 한 이 새는 무심히 나뭇가지 위에 앉아 나를 내려다봤다. 그러다가 “끼아아아악”하면서 소리를 질렀다. 아! 집 앞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울던 녀석이 너였구나! 찾아보니 이 녀석은 ‘조폭’으로도 통한다. 무리지어 살면서 어떤 곳에 먹을 것이 발견되면 죄다 몰려와 주변을 초토화시킨다고. 그리고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새가 공격해도 쫄지 않고 반격에 나서는 건 물론이고, 작은 참새도 무차별 공격한다고. 울프컷 헤어스타일을 멋으로 장착한 건 아니었다.
대충 3시간 정도 산에서 새들을 관찰하고 내려왔다. 집 근처에는 여전히 참새 녀석들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.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.
“어머, 쟤 또 여기로 온다! 집에서 쫓겨났나? 왜 자꾸 온대?”

동고비
회색 정장을 차려 입은 것 같은 깔끔한 모양의 새가 등장했다. 찰칵찰칵 재빨리 사진을 찍고 대충 스케치! 이 새는 나무의 구멍에서 들락날락했는데, 짧은 부리로 나무에 구멍을 저처럼 깊게 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, 딱따구리 녀석들이 뚫어 놓은 곳을 둥지로 바꿔놓은 것 같았다. 동고비도 참새와 가깝다. 울음소리가 특이하다. “휘익, 휘익, 휘익, 휘익, 휘익” 대체로 이렇게 다섯 번 휘파람을 분다. 잠깐, 얘네들은 집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, 딱따구리가 만든 구멍이 산 도처에 널린 건가? 서로 집을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할 것 같다. 찾아보니 동고비는 12월부터 집을 보러 다닌다고. 딱따구리는 집을 여러 채 만들어 놓는데, 그중 빈 집을 찾아 잽싸게 차지한 다음 진흙을 물어와 입구를 좁혀 다른 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. 간혹 주인이 있는 딱따구리집에 들어가 진흙으로 입구를 막기도 하는데, 다시 돌아온 딱따구리가 진흙 벽을 허물어도 다음날 또 포기하지 않고 내 집 장만에 매달린다. 이거 참, 청약 당첨을 위해 날이면 날마다 인터넷을 뒤졌던 누구와 꼭 닮았다.

새 관련 재미있는 장비
버드콜Bird Call
나무조각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둥근 쇳조각을 넣어 만든 이상한 장비. 동그란 쇠 손잡이를 잡고 돌려 나무조각과 마찰을 일으키면 “끼익 끼익” 소리가 나는데, 힘 조절을 잘하면 마치 새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. 숲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면 새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‘버드콜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. 오드본Audubon이라는 브랜드 제품이 유명하다.

새 관련 재미있는 책
<큰오색딱따구리의 육아일기> 김성호 저, 웅진지식하우스
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가 큰오색딱따구리를 50일 동안 관찰하며 쓴 이야기. 딱따구리 외에 다양한 새들의 생태와 주변 환경까지 실려 있다.
<동고비와 함께한 80일> 김성호 저, 지성사
큰오색딱따구리를 관찰하다가 딱따구리의 빈 둥지를 서성이는 동고비를 발견, 이후 80일 동안 동고비를 관찰하며 썼다.
본 기사는 월간산 2022년 4월호에 수록된 기사입니다.

